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구조적 전환기
작성자 : 이종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5.07.31 게시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중요성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투자자가 해외의 사업체에 장기적인 지분 참여를 통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투자이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생산시설 설립, 지사 및 자회사 설립, 합작투자,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자본수지 흑자 구조로 전환되며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고, 최근 10년간 FDI는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공급망 확보, 기술 선점, ESG 대응 등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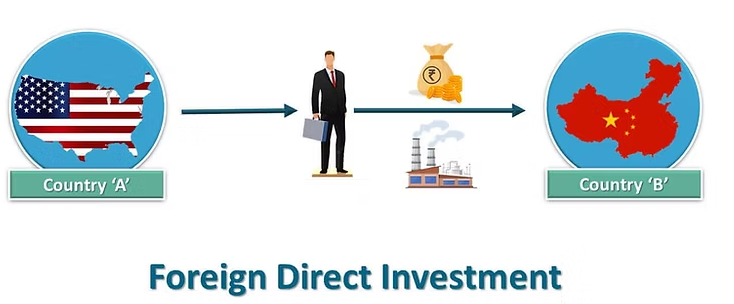
그림1. FDI
EduCBA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과 FDI의 필요성
오늘날 FDI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그 전략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무역장벽을 우회하거나 로컬화 전략으로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경쟁 격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나 현지 R&D센터 설립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기술 생태계 편입을 위한 주요 전략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 팬데믹은 공급망의 단일화·집중화 위험을 극명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다변화된 해외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과 같은 분산형 GVC 재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확장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핀테크 등의 산업도 글로벌 확장이 활발하다. 한국 스타트업 및 ICT 기업은 디지털 FDI를 통해 해외 플랫폼 시장을 공략하고, 현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요구 국제 환경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인해, 친환경 생산기지 구축,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보, 녹색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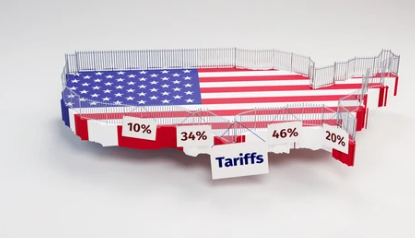
그림2. 보호무역주의 예시
웹자료
한국 기업의 FDI 전략 사례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조지아주에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생산공장 신설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IRA 규정에 대응한 전형적인 ‘생산기지 현지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글로벌 동맹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GM, Honda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북미 및 유럽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 공동 R&D, ESG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FDI로 평가받는다. -네이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확장 네이버는 유럽과 북미의 콘텐츠 플랫폼과 기술 스타트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AI 기술기업 ‘자피르(Zefyr)’ 인수, 북미 웹툰 플랫폼 ‘왓패드(Wattpad)’ 인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FDI 전략으로, 네이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 자원 확보형 FDI 포스코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과 리튬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에 원재료 확보형 FDI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한 ‘자원·에너지 안보형 투자전략’의 일환이다.
부산지역 FDI 실적현황
2024년 1분기 부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며 총 2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부산의 FDI 신고액은 2억700만 달러, 도착액은 2억500만 달러로, 이는 1997년 이후 27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도착액이 신고액에 근접한 점은 외국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투자 급증은 정보통신(IT), 전기·전자,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싱가포르, 미국, 중국 등 16개 외국계 기업이 참여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들 수 있다. 2024년 1분기 부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급증은 지방도시도 전략적 유치 활동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거의 일치한 점은 외국 기업의 실질적 사업 의지와 부산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며, IT 및 첨단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시사한다.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참여한 점은 부산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을 나타내며,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과 향후 FDI 유입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림3. 부산지역FDI현황
부산시보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FDI를 단순한 자본 확장이 아닌 전략적 성장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선제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정책,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미국 IRA 등 자국산 우대정책에 대응해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으로 생산·조달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SK온과 OCI는 탄소국경세 및 ESG 규제 강화에 맞춰 친환경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AI·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와 현지 R&D를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두나무는 디지털 플랫폼 및 블록체인 기반 무형자산 FDI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본 사이트(LoTIS. www.lotis.or.kr)의 콘텐츠는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단어 | |
| 자료출처 | |
| 첨부파일 |
| 집필진 | ||